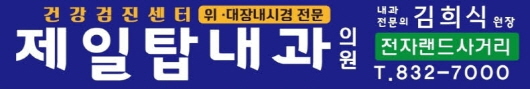백종일 전북은행장이 올해 말 임기를 마치면서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국내 사업에서 일정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캄보디아 현지법인 프놈펜상업은행(PPCB)과 범죄 연루 의혹 기업 프린스그룹(Prince Group) 간 거래 리스크가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 4곳이 프린스그룹에 지급한 예금 이자는 총 14억5천4백만 원. 이 중 절반 이상이 전북은행 몫으로 7억870만 원에 달한다. 국민은행 6억7천3백만 원, 신한은행 6천1백만 원, 우리은행 1천1백만 원이 뒤를 이었다. 현재 프린스그룹 관련 자금 911억7천5백만 원은 국제 제재 조치에 따라 동결된 상태이며, 전북은행이 보유한 금액만 1,252억8백만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전북은행의 문제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다. 가상자산 자금 세탁 의혹을 받는 후이원 그룹(Huione Group) 당좌예금을 관리하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Gopax)’ 실명계좌 제휴 은행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리스크 관리 부실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국내 실적도 안심할 수 없다. 2024년 2분기 기준 연체율은 1.58%로 국내 평균 0.52%를 훌쩍 넘어섰다. 예대금리차는 6~8%p 수준이며, 서민금융 제외 가계 예대금리차만 5.86%로 수협은행의 5배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이자 장사’ 구조는 지역민과 서민에게 돌아갈 금융 혜택을 가로막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역민과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의 소극성이다. 전북은행은 지역사회 투자, 소상공인 대출, 장기적 지역 금융 활성화보다는 단기 수익 중심의 운용에 치중해왔다. 은행이 지역 기반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고금리 예대차로 이익을 챙기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이자 장사’와 지역민 인색함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구조적 한계 또한 명확하다. 단기 수익 중심 경영과 디지털·ESG 등 신성장 전략 부재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단기 성과에 매달리는 구조에서는 평판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해외 거래 리스크는 은행 신뢰도와 직결되며, 내부 통제 능력 없는 리더십은 조직을 흔든다”고 직설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과 정부는 전북은행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단순한 은행장 개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지역 금융 안정, 글로벌 거래 리스크, 평판 문제까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금융당국은 내부 경영 리스크를 직접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와 금융당국의 ‘레드카드’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 셈이다.
결국 백종일 행장은 국내 실적에도 불구하고 연임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거래 논란, 이자 장사 논란, 지역민 지원 소극적 운영, 평판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조직 신뢰 회복과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해졌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은행장 연임 문제를 넘어, 한국 지방은행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다. 지역 기반 수익과 단기 성과에 의존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한, 평판과 수익성을 동시에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방은행이 변화를 거부하면, 단순한 연임 논란을 넘어 구조적 리스크와 지역사회 불신, 그리고 중앙정부와 금융당국의 직접 개입이라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조용환 칼럼니스트 / 전 군산대 겸임교수